이역을 상상하다(想象异域)
豆瓣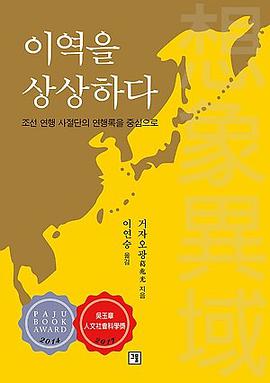
以朝鲜燕行使节团的燕行录为中心
조선 연행사절단의 연행록을 중심으로
葛兆光 译者: 李妍承
简介
“상상”이 기억으로 남은 역사, 바꾸어 말해서 “한국인이 상상했던 중국”,
그 사실과 역사 사이의 괴리가 빚어낸 역사의 진실은 무엇일까?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확인하지 못한 사물을 호기심이 그려내는 것을 인문학에서 “상상”이라고 한다면, 과학에서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상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상상이 기억으로 남아 전해지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역사기억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
17~19세기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을 어떻게 상상했을까?
저자는, 당시 중국을 오랑캐가 차지한 비참하고 황량한 땅이라고 여겼던 조선 사신들의 ‘상상’ 속에서 펼쳐졌던 사건이 기억으로 전해지면서 ‘역사기억’으로, 나아가 일종의 ‘역사적 사실’로 발전한 양상을 추적하여 보여준다.
저자는 “의관(衣冠)”이라는 상징에 주목하면서 만주족이 어떤 방식으로 의관을 통한 통제정책을 펼쳤는지, 청대의 변발을 오랑캐의 의관이라고 조롱하던 조선의 사신들은 명대의 의관을 고수하면서 청나라의 복식을 받아들였던 한족 지식인들 앞에서 어떻게 문화적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했는지 등을 조사 연구하여 흥미롭게 서술하였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가 조선의 연행사절단들이 북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演?를 접하면서 연희 무대의 배우들은, 만주족이 강요했던 일반적인 복식이 아니라 명대의 의관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족의 위의(威儀)를 무대 위에서나마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리라고 추측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저자가 종종 언급하는 ‘거울’의 역할, 즉 타자를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어떠한 빛이 어떻게 투과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포착되었던 소재들이다.
저자는 매년 정월 초하루 새벽에 거행하였던 황제의 “당자(堂子) 제사”에 관하여 조선의 연행사들은 기이하고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관찰하였고, 일이백 년 동안이나 황제의 비밀스러운 이 행차가 누구에게 바치는 제사인지 궁금해 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멈추지 않았던(상상했던)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예들을 통하여 “이역(異域)”이란 말은 조선 연행사신들이 경험했던 중국을 가리키며, “상상”이란 주로 청나라에서 보고 들은 조선인들의 기록에 나타난 중국에 대한 상상을 가리키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인이 상상하는 주국”인 셈이다.
정치상의 ‘사대주의 및 조공무역체계’와 문화상의 ‘소중화사상’은 어떻게 서로 뒤섞여 조선과 중국 사이의 상호인식에 영향을 주었는가? 소위 ‘조공권’ 안에서 ‘종주국’ 청나라와 조선 등 ‘번속국’들은 대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의 중국과 조선뿐 아니라 현재의 중국과 한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이 책이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좋은 본보기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contents
일러두기 · 007
한국어판 서문 · 009
자서 · 013
제1장문헌 개설: 조선과 일본 문헌 중의 근세 중국사료
이끄는 말: 거울을 들고 자신을 비추어보다023
1. ‘동아시아 한문 문헌’의 발견: 경이로울 만큼의 풍부함026
2. 외국인의 시선: 조선과 일본 사료의 가치035
3. 중국을 벗어나자: 중국을 되돌아보기 위하여043
4. 정리를 기다리는 자료의 보고: ??연행록전집??의 사례046
5. 이웃을 거울삼자: 전통문화를 바로잡자는 것만이 아니다051
제2장 시대적 배경: 17세기 중엽 이후 중국에 대한 조선의 관찰과 상상
이끄는 말: ‘조천(朝天)’에서 ‘연행(燕行)’으로055
1. 만력제 때부터 말해보자: 명나라에 대한
조선인들의 친밀감058
2. 남의 집을 빼앗은 것인가?: 청나라에 대한
조선인들의 멸시와 편견070
3. 누가 중화인가?: 조선 사신들의 청나라 관찰081
4. 유학[斯文]의 재앙: 조선인들이 본 청대의 학술088
5. 방관자가 더 정확히 보는 법이다: 조선 사신들은 청나라의
화하문화가 타락한 사실에 대하여 냉정한
시선으로 관찰했다098
6. “명대 이후 중국은 없다”: 17세기 이후 동아시아에
여전히 동일한 정체성이 있었는가?105
제3장 나라를 떠나면서 고향을 그리워함: 압록강변의 감회
이끄는 말: 압록강변111
1. 고향을 떠나기 전: 의주에서 마음껏 즐기다.113
2. 마음은 고국을 그리워하는가? 이국행에 대한 불안함122
3. 번거로움을 줄이다: 국경을 떠나기 전의 자기검열127
4. 고향을 떠나는 슬픔: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물인가?134
제4장 오삼계(吳三桂)는 결코 강백약(姜伯約)이 아니다!
이끄는 말: 산해관 주변에서 역사기억을 이끌어냄139
1. “중화의 난적”: 급작스럽게 커다란 변화에 부딪쳤던 초기의 평가142
2. 꿈틀대는 듯한 움직임: 삼번의 난을 보는
조선 군신의 복잡한 심경147
3. 기회를 엿봄: 기다리던 결과152
4. 요동 견문: 산해관 밖에 흩어져 있던 오삼계의 옛 부하들157
5. “한가로이 앉아 지나간 현종 시절을 이야기하다”:
오삼계 부하가 천보의 과거사를 말하는 것을
조선 사신이 듣다.166
에필로그: 관 뚜껑을 덮고 나서 평가하다.170
제5장 이역의 슬픔을 상상함: 200년 간 계문란에 대한 조선 사신들의 멀고 먼 상상
이끄는 말: 강남 여인 계문란의 제시(題詩)175
1. 조선 사신들의 상상 속에서는 언제나 오랑캐가
중화를 어지럽혀 일어난 가족 이산의 비극이 나타남180
2. 계문란 제시의 이야기: 전고와 상징이 되다184
3. 상상에 의거하여 역사를 바꾸다189
4. 개인적 비극은 어떻게 역사적 정극(正劇)이 되는가?195
5. 동정의 눈물은 어떻게 책망의 목소리가 되는가?199
에필로그: 동풍은 여전히 진자점에 불어,
계문란을 떠올리며 통곡하게 하는구나205
제6장 밝은 촛불은 이유 없이 누구를 위해 사르는가?: 청대 조선의 조공사신 눈에 비친 계주(?州)의 안록산 묘와 양귀비 묘
이끄는 말: 유적·기억·상상207
1. 계주성 밖의 취병산209
2. 사당에 들어가 그 누가 상심하지 않겠는가!212
3. 혹시 이적(夷狄)의 옛 풍속인가? 218
4. “중국인의 분노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니,
그래서 이 같은 말이 있는 것인가?”223
에필로그: “이 천하를 누가 차지하는가?”231
제7장 명나라의 의관은 어디에 있는가?
이끄는 말: 뜻밖에도 전 왕조의 의관을 보다.235
1. 옛 의관: 뜻밖에 열린 역사기억의 문238
2.변함없는 옛 왕조의 복색: 오직 유민이 있는 것인가?242
3. 연극무대: “배우들은 모두 옛 의관을 입는다.”249
4. 외국 사절단의 관복: 교화의 정령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면제권255
5. 한족 부녀의 복식: 한복과 호복 사이의 모호함262
에필로그: “준시(遵時)”, 즉 때에 따르는 일반 민중266
제8장 당자(堂子)에서는 혹시 등(鄧)장군을 제사하는가?
이끄는 말: 정월 초하루 새벽녘의 북경 황성273
1. 연초의 행사: 당자에서 제천의례를 거행하게 된 내력276
2. 조선인들의 상상: 등장군(鄧將軍) 혹은 유제독(劉提督)283
3. 역사가 기억이 될 때와 기억이 상상이 될 때290
제9장 뜻밖에 오랑캐의 수도에서 한족 문화의 위의(威儀)를 다시 보다: 북경에서의 연희(演戱)에 대한 조선 사신들의 관찰과 상상
이끄는 말: 청대 중엽 북경 성 안의 희곡 연출295
1. 연경의 무대: 궁정·촌락·도시의 다원에서 열리는 연희299
2. 다원(茶園) 공연의 가격·그 역할과 기타 사항들311
3. 황권의 유지, 보호를 위한 교화인가?
아니면 한족의 기억을 남기기 위한 것인가?319
에필로그: 연희는 끝나도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다.328
제10장 이웃집의 낯선 사람: 청나라 중기의 조선이 서양을 대면하다
이끄는 말: 가경 6년에 올라온 한 건의 보고 333
1. 갑작스레 이방을 만나다: 정말로 특별한 인물336
2. 강 건너 불구경: 북경에서 서양의 풍경을 보다.347
3. 호기심과 호감: 점차 사라지는 우정353
4. 진정한 접촉: 오히려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냄357
에필로그: 사소한 의심이 끝내 증오를 낳다364
부록 1 조공(朝貢)ㆍ예의(禮儀)ㆍ의관(衣冠)
이끄는 말: 승덕(承德)에서의 문화 대결 367
1. 조선 연행사신들이 의아하게 여겼던 것370
2. 안남 국왕이 친히 조공하러 감: 건륭 55년의 이야기373
3. 여(黎) 씨·완(阮) 씨의 왕조 교체:
두 안남 국왕에 대한 황제의 은덕이 크게 다름.377
4. 승덕(承德)에서: 만수절 축하연에서의 안남 사절단387
5. 면류의관: 정치적 승인과 문화적 일체감396
마치는 말: 청나라 주변국이 모두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403
부록 2 19세기초 서양종교를 대면했던 조선ㆍ일본과 중국
이끄는 말: 로마에 묻혀 있던 백서 한 장407
1. 냉담에서 당황으로: 신유교난 전후의 조선411
2. 금교 이후의 고요함과 저류 417
3.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진노하게 됨: 청나라
가경제의 반응423
결어: 쇄국과 개국 사이를 새로이 재고하는 동아시아 삼국429
부록 3 이웃의 눈을 빌어 동아시아와 중국을 새로 헤아려보다
이끄는 말: 학술사로부터 말하다.439
1. 백 년간 현대 학술사의 흐름에서 본 조선과 일본 문헌의 의의 439
2. 최근 20년 이래의 변화: 중국에서 조선연행문헌을 인식함444
3. 세 가지 방면: 조선 연행문헌 연구의 초보적 진전446
4. 부족함을 알게 된 후에 얻는 바가 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451
후 기 · 454
참고문헌 · 456
정오대조표 · 464
역자의 말 · 467
찾아보기 · 477
